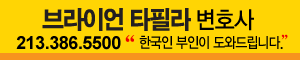부산영화제 찾는 관객 수 20만… 흥행 참패한 영화 한 편에도 못미치는 숫자
부산에서의 열기, 일반 극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각종 지역 영화제, 관객 아닌 영화인들 먹거리로 활용되기 일쑤

해임되었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전양준 부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복귀한 후 화려하게 닻을 올린 2018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화제(10월 4일부터 13일) 개막식 중계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1년 사이에 개막식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내로라 하는 영화계 스타들이 줄줄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모처럼 축제 다운 축제의 시작을 알린 개막식이었다. 일본의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특별 공연은 축제를 더욱 화려하고도 우아하게 장식했다.
반면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던 지난해 개막식은 ‘썰렁’ 그 자체였다. 지난 2014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영화계의 갈등이 불거졌고, 많은 영화인 단체들이 부산영화제 참가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특정 영화의 상영 여부에 대해 ‘특정’한 정치색을 지닌 지방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영화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식 바깥의 일이었음은 자명했다. 여하튼 그 사태로 말미암아 부산은 20년 가까이 쌓아온 아시아 최대 영화제라는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가하고 말았다.
◇ 부산영화제 20여년간 외형은 커졌으나 관객은 제자리 걸음
다행히 올해부터 부산은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해임되었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전양준 부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복귀했다. 영화계 단체들도 보이콧을 철회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스타들이 마음 편하게 개막식을 빛낼 수 있었다. 잠시나마 궤도에서 이탈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싶다. 정확히 말해 영화제가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쓴소리다. 영화제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어떤 영화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매진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온다. 그런데 영화제에서 인기를 얻는 영화들이라는 게, 곧 있으면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태반이다.
올해만 해도 10월 중에 개봉하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예매 오픈 1분만에 매진되었다. 이나영의 복귀작이자 개막작 ‘뷰티플 데이즈’, 김향기 주연의 ‘영주’, 배우 추상미의 연출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같은 한국영화들도 매진 대열에 합류했다.
문제는, 이들 영화에 대한 부산에서의 열기가 일반 극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매진 영화들 가운에 극장 개봉했을 때 흥행 성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은 과연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내 기억에 부산국제영화제 매진작 가운데 극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손에 꼽을만 하다.
이것은 역설적이며 씁쓸한 현상이다. 영화제라는 시공간 안에서만 ‘자아도취적 열기’를 뿜어낼 뿐, 부산영화제가 그 열기를 좀더 광범위한 대중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론에서는 대단한 행사인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지만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관객수는 2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열흘동안 200편이 넘는 상영작을 보는 관객수다. 따지고 보면,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한 단 한 편의 상업영화가 모으는 관객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조금 흥행이 잘 된 독립영화 한 편의 관객수에 맞먹는 수치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부산영화제 출범 초기,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거의 비슷한 관객수를 기록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부산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으로 상징되는 외형적 규모는 커졌으되, 관객 규모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소 뜬금 없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지역 영화제, ‘끈 떨어진’ 영화인들의 먹거리 창구?
사실 이건 부산영화제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난립하고 있는 영화제들 역시 관객 동원에 애를 먹고 있다. 간혹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위해 지역 영화제를 찾으면 텅 빈 객석에 내가 다 민망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떤 관객들은 ‘관객과의 대화’ 행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 영화 상영이 끝난 직후 우르르 상영관을 빠져나가 버리기 일쑤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 영화제들이 지자체의 전시 행정적 성격이 짙은데다, 사실상 ‘끈 떨어진’ 영화인들의 먹거리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냉소적으로 말해, 어떤 영화제는 관객이 아닌 영화인들의 존재 증명을 위해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영화제에서조차 곧 극장 개봉할 영화들에 관객들이 몰리는 현상은 영화제의 본질을 무색하게 만든다. 영화제는 기왕 개봉할 영화를 조금 더 일찍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다. 영화제는 상업적 유통망으로서의 극장이 오로지 한국과 미국 영화만 틀어대느라 담보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펼쳐 놓는 행사다.
지구상에는 수 천 개의 문화권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협소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 즉, 영화제는 다양성의 해방구여야 한다. 현실은 그러한가? 물론 메뉴는 다양하다. 그러나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조차 곧 동네 식당에서도 팔 게 뻔한 인기 메뉴를 일찍 먹어 보는 걸로 자족한다. 정상화의 물꼬를 텄으니 샴페인을 터트리겠지만, 이건 부산국제영화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안고 가야할, 그리고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다. 이대로 가면, 부산도 폐쇄적 ‘게토’가 된다.
다시 묻자. 영화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댓글 0
|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 64 |
Dr. Pure Natural 책
| 832 |
| 63 |
최강의 야채 수프
| 309 |
| 62 |
"난 매번 지금이 제일 행복해" 신구의 인생 단맛
| 335 |
| » |
겉으로만 성황인 부산영화제, 폐쇄적 게토 되려는가
| 336 |
| 60 |
'보물 2000호' 탄생
| 318 |
| 59 |
소더비 경매서 14억에 낙찰된 작품, 저절로 찢어져
| 328 |
| 58 |
[송동훈의 세계 문명 기행] [14] 탕·탕… 두 발의 총성에 사랑도 영광도 끝났다
| 431 |
| 57 |
연쇄 은행강도 벌이는 7순 노인 역, 로버트 레드포드 ‘마지막 작품’ 관심
| 359 |
| 56 |
홀로코스트서 구해준 은인 찾아 남미서 유럽으로 떠나는 노인 유머·인간미 가득한 로드 무비
| 564 |
| 55 | [ 책 / 책소개 /책리뷰 ]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 334 |
| 54 |
‘호텔 아테미스’ 간호사 役 조디 포스터
| 314 |
| 53 |
[지금 이 책] 프랑켄슈타인
| 320 |
| 52 |
[미술] 파리의 셀러브리티 日 후지타 사망 50주기
| 320 |
| 51 |
런던 한복판 육교에 한옥 한 채 날아와 걸렸네
| 334 |
| 50 |
어디선가 본 장면의 연속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