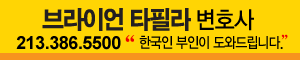좀비물에 시대극 접목한 ‘창궐'... ‘물괴'와 구도 다르지 않아
한국 영화계, 2007년 투자수익률 마이너스 40%대 악몽 덮칠까

장동건, 현빈 주연의 아귀 액션 블록버스터 ‘창궐'.
한 영화를 향한 최대의 모욕은 이미 신랄한 비판과 흥행 참패를 경험한 이전 작품에 그 작품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모욕을 감행할 작정이다. 영화 ‘창궐’은 ‘물괴’의 아류다. 알다시피 ‘물괴’는 관객들의 거센 야유와 함께 72만 명 관객 동원이라는 초라한 흥행 성적을 남겼다. 그런데 ‘창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
내가 ‘창궐’이 ‘물괴’의 아류라고 한 것은 두 작품의 컨셉트와 인물 구도가 서로 빼다 박았기 때문이다. ‘물괴’가 괴수물을 시대극에 대입해 놓고 참신하다는 자아도취에 빠졌다면, ‘창궐’은 좀비물을 시대극에 접목했다. 이 어색한 조합이 참신하다고?

◇ ‘물괴’와 ‘창궐’은 낯선 것과 낯선 것의 조합
내가 알기로 대부분의 흥행 영화들이 추구하는 참신함은 익숙함과 낯선 것의 조합에서 나온다. 이를테면 봉준호의 ‘괴물’(2006)은 한강이라는 낯익은 공간에 괴수라는, 당시로선 낯선 소재가 결합되었기에 참신했다. 이 영화는 결국 가족애라는 보편 가치를 말하고 있기에 흥행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숨바꼭질’(2013)은 아파트라는 익숙한 공간에 나도 모르는 누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낯선 스릴을 얹었다. ‘부산행(2016)’은 KTX라는 익숙한 공간에 좀비라는, 당시 한국 영화로선 낯선 소재를 접목했다.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부산행(2016)’은 KTX라는 익숙한 공간에 좀비라는, 당시 한국 영화로선 낯선 소재를 접목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물괴’와 ‘창궐’은 낯선 것과 낯선 것의 조합이다. 아니, 거꾸로 익숙한 것과 익숙한 것의 조합일지도 모른다. 두 영화에서 소재의 조합보다 더 익숙한 것은 스토리 라인인데, 익숙한 스토리란 곧 진부함을 뜻한다. 왕(박희순)과 그를 지키려는 윤겸(김명민), 그리고 역모를 꿈꾸는 신하(이경영)의 대립 구도에 물괴가 핑계처럼 불려 나왔다. ‘창궐’도 대동소이하다. 왕실을 지키려는 강림대균(현빈)과 새로운 권력을 노리는 병조판서(장동건)의 대립 구도에 ‘야귀’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버전의 좀비 떼가 핑계로 불려 나왔다.
왜 하필 좀비일까? 굳이 길게 생각할 필요 없다. 현빈이 멋지게 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떼로 몰려 드는 좀비들의 머리와 팔을 댕강댕강 잘라대도, 크게 잔인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칼을 휘두르는 현빈 만큼은 멋지게 보인다. 그래서 ‘불려 나왔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창궐’은 이 진부한 스토리에서조차 만족을 느끼지 못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영화 후반 억지스러운 감동과 비장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투적인 장면들을 나열한다.

◇ 한국영화에서 결핍된 ‘진정한 참신함'의 힘 보여준 ‘퍼스트맨’
요즘 한국영화는 진부한 전법으로 관객들의 호주머리를 털 생각에 골몰해 있다. 마치, 조폭 코미디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200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국영화는 2007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를 넘기는 대공황에 빠져 들었다. 작금의 한국영화가 그런 상황이 재현될 징후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창궐’보다 한 주 앞서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퍼스트맨’은 지금의 한국영화에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설적인 답이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런 류의 영화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영웅화의 관성에 빠져 들지 않는다. 오히려 암스토링이 가진 가족사적 비극과 그로 인한 상처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이다.
닐 암스트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퍼스트맨'은 이런 류의 영화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영웅화의 관성에 빠져 들지 않는다.
33살의 젊은 천재 감독 데이미언 셔젤의 영리한 시청각적 설계 역시 관객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안겨주는데, 좁은 우주선 조종석의 미세한 카메라워크와 사운드, 우주선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는 인물의 시점 쇼트와 표정 몇 개만으로도 마치 관객이 우주선 안에 앉아 있는 듯한 현실감을 만들어낸다.
‘퍼스트맨’의 태도는 어떠한가. 냉전기 미국과 소련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포착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다. 이 영화는 닐 암스트롱이라는 역사적 영웅을 통해 미국의 위대함에 도취되려는 유치함에서 가볍게 벗어나 있다. 그 태도가, 영화의 만듦새만큼이나 눈부신 것이다.
진정한 참신함이란 그런 것이다. 주류 영화의 관성에 익숙한 관객들의 예상을 보란 듯이 비껴가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감독의 인장을 찍는 것. 최근 한국영화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관객들의 수준을 휘뚜루마뚜루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대충 만족할 거야‘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