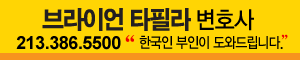글 수 1,825
한국판 ‘300’ 시도했으나 독창성 부족했던 ‘안시성'
‘관상' 카피했으나, 캐스팅도 주제의식도 못따라간 ‘명당'
손예진 낭비하고 영화의 80%를 지문으로 채운 ‘협상'

추석 본게임에 출전한 영화 중 초반부터 우위를 선점한 영화 ‘안시성'.
추석 극장가가 대목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지난해처럼 비정상적으로 긴 연휴가 아닌 이상, 고작 나흘에서 닷새 정도의 연휴라봤자, 흥행적으로 큰 재미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렛대 효과는 얻을 수는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관상’(2013), ‘사도’(2015), ‘밀정’(2016) 등의 영화가 추석 연휴 기간의 흥행세를 바탕으로 대규모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 제작자들 추석 대목 노리지만, 영광은 한 편에게 몰려
하지만 여기에도 전제가 있다. 관객들의 만족도가 연휴가 끝난 이후의 흥행세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그 어떤 제작자도 ‘장렬하게 망해 보자’는 심산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지렛대 효과가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며,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추석 연휴를 노린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단 한 편의 영화에게만 영광을 허락한다.
올해 추석에도 이미 완전히 망해 버린 ‘물괴’까지 포함하면 모두 4편의 영화가 출사표를 던졌다. ‘언감생심’ 기선제압 시도가 헛물로 끝난 ‘물괴’를 뺀다면, ‘안시성’ ‘명당’ ‘협상’ 등 3편이 본게임에 출전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편 모두 고만고만한 만듦새였다. 물론 모든 경쟁과 마찬가지로 세 편 가운데 비교 우위는 있었다. ‘안시성’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과연 ‘안시성’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만한 작품인가?
‘안시성’은 한국판 ‘300’과도 같은 기획 영화다. 당 태종 이세민이 이끈 20만 대군에 맞선 고구려 안시성의 5천 군사의 전투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볼거리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소재다. 그러나 그 뿐이다. 전투신의 규모가 단계적으로 커지는 공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되, 그 충실성에는 독창성이 빠져 있다. 대놓고 영화 ‘300’의 액션신을 흉내낸 것부터 그렇다. 그런 잔재주는 보기에 민망하다.

프랭크 밀러와 린 발리의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300(2007)’.
파소(엄태구)와 백하(설현)의 러브 라인을 슬쩍 끼워 놓고, 관객들의 민족주의적 관성에 영합하기 위해 사물(남주혁)이라는 캐릭터를 창안한 것은 영리하다기보다 영악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영화의 영악함은 지나치게 상투적이라는 게 문제다. 상투성에 기대지 않으면 흥행할 수 없다는 강박이 ‘안시성’에도 가득 차 있다.
그나마 ‘안시성’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 상투성을 비교적 잘 써 먹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함께 개봉한 ‘명당’은 상투성의 공식을 다 알고도 해답을 찾지 못한 ‘수학 포기자’의 작품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응용력 제로다.
‘명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미 흥행 성공한 영화 ‘관상’을 벤치마킹했는데, 그 영화의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대입했기 때문이다.

송강호, 김혜수 등 출연 배우들의 초상 사진 포스터로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 ‘관상'.
‘관상’의 수양대군(이정재)은 ‘명당’의 흥선군(지성)으로, 김종서(백윤식)는 외척세력 장동 김씨(백윤식)로, 관상가 내경(송강호)은 지관 박재상(조승우)으로 카피했다. 그런데 이 카피에서 중요한 게 빠졌다. ‘관상’은 사람의 얼굴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전근대 사회의 믿음을 드라마를 밀고 나가는 핑계로 활용했다.
‘관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권력 다툼에 휘말려 자신의 재능을 허비했던 한 인간(송강호)이 결국 그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 이야기의 중심축이었기 떄문이다. 이 시대의 정신 못차린 아버지들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기도 했다. ‘명당’은 그 주제 의식까지 벤치마킹할 수 없었다. 그래서 틀만 살짝 빌려 왔다. 창의적이며 통찰적 주제를 싣지 못한 게 패착이다.
캐스팅의 위력도 약했다. 조승우는 송강호를 이길 수 없으며, 지성은 이정재를 능가할 수 없다.

한국인의 땅에 대한 집착을 모티브로 밀고 가는 영화 ‘명당'의 두 주연 배우 조승우와 지성.
그렇다면, 현빈과 손예진 카드를 집어든 ‘협상’은 왜 부진했을까? 다른 모든 작품들이 시대극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현대극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관객들의 냉대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컨셉트는 참신했다. 손예진이 인질극 전문 협상가로, 현빈이 인질극을 벌이는 악당으로 나오는 구도부터 그렇다.
그러나 그것 뿐이다. 이 영화는 스토리상의 치명적인 허점을 안고 있는데, 결말 부분을 보면 앞의 이야기들이 전혀 소용 없어진다는 것이다. 관객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현빈은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변죽만 울렸을까. 이 영화에서 현빈과 손예진이 벌이는 협상 과정은 행동의 동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들 뒤에 도사린 배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즉, 영화의 80%가 지문인 셈이다.
◇ 올해 추석 영화들이 지금 한국영화의 실력… 돈 댄 자들이 만든 판
게다가 손예진은 협상가로서의 아우라가 전혀 없다. 그건 손예진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이 처음부터 감정 이입의 창구로서만 그녀를 소비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즉 이 영화에서 '의지'를 가진 자는 오직 현빈 뿐이다. 통찰적인 영화는 의지와 의지의 대립과 충돌 속에서 보편적 감성을 뽑아 낸다. ‘협상’에는 그게 빠져 있다.
요즘 부쩍 ‘볼만한 한국영화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독창성의 실종. 언제부터인가, 천만이라는 로또를 쥐어 든 영화가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영화들이 시시해졌다. 이렇게 된 이유 역시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투자 총괄, 투자 책임, 어쩌고 하는, 돈을 댄 자들의 이름이 감독 배우에 앞서 가장 먼저 크레딧에 오르는 상황이 한국영화의 제작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필연적으로 돈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영화가 시시해 진다. 암기력은 있지만 이해력과 응용력이 없는 것. 정확히, 올해 추석 영화들이 지금 한국영화의 실력이다. 돈을 댄 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최광희는 YTN 기자와 영화주간지 FILM2.0 온라인 편집장을 거쳐 현재 영화평론가로 활동중이다. 영화를 텍스트로 분석하는 공정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이 칼같은 글을 쓰는 것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있다. 현재는 기획사 '흥업미디어'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