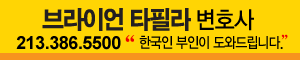하늘의 비행기는 위험할 수 있어도 땅 위의 공항이 위험할 거란 생각은 못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인식에 뼈아픈 경종을 울린 게 이번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다.
항공기 사고가 대부분 이착륙 때 발생하는 걸 생각하면 공항이야말로 안전이 최우선인 게 자명한데도 열흘 전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다 철벽같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는 장면을 보기 전까진 공항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공중의 생명들이 무사히 착지하도록 완충해주는 에어매트나 다름없다.
공항공사 사장 13명 중 경력자 단 2명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의 안전은 국토교통부가 지휘 감독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실무를 맡는다.
대한항공사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김포, 제주 등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비해 공항 내 시설물을 부서지기 쉽게 유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공항공사가 하고 있다.
이번 참사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4년 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공항공사가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개량공사를 발주하면서 부러지기 쉽게 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오히려 두께 30cm 콘크리트 상판을 더 얹는 공사가 이뤄졌다. 경위는 따져봐야겠지만 공항공사가 관리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공항공사의 수장이라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기관장의 안전 의식과 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항공사 사장 모집공고에 ‘공항 분야 지식과 경험’이 자격 요건으로 명시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사장 13명 중 공항이나 항공 운항 경력자는 2명뿐이다. 나머지 11명은 경찰, 군,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낙하산들이다. 3년 임기 중 업무 파악에만 1, 2년이 걸린다고 한다.
사장들 면면을 보면 이 자리가 낙선자 보은 인사나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은 총선 낙선 이듬해인 2013년 사장에 임명됐는데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했다. 손창완 전 사장도 경찰대학장에서 물러난 뒤 총선에서 낙선하자 사장에 임명됐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왔다가 임기를 반도 안 채우고 나간 뒤 대전시장에 재선됐다. 공항공사 사장직이 정치인들의 경력 공백을 메워주는 정거장이었던 셈이다.
현재 공항공사 사장은 8개월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된 국정원 차장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퇴진 압박성 감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4월 돌연 사퇴했다. 그러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됐는데 그는 여러 불법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야당이 반발했고 임명은 무산됐다.
전·현 정권의 낙하산 경쟁에 따른 리더십의 부재 속에 이번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47일 전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해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라도 조류 퇴치 활동을 강화하고 활주로 시설을 점검했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다. 정치권 낙하산 경쟁에 안전 리더십 실종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에는 정치 논리로 지어진 적자 공항들이 적지 않다.
안전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가가 수장으로 와도 모자랄 판에 낙하산 사장들로 어떻게 공항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정치권은 야당일 땐 전문성 운운하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고 나면 똑같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공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낙하산들의 공항 착륙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