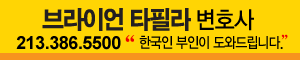'서울의 봄' 현실 속편, 그때와 뭐가 달랐을까?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번엔 단 155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영화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과거의 ‘서울의 봄’과 2024년의 비상계엄, 무엇이 같고 또 달랐을까요?
아이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온 날. 실화를 각색했다고 알려주며 ‘검문’ ‘금서’ 같은 기억 조각을 꺼내 5공화국 당시 사회적 상황을 들려줬다. “진짜야?” 돌아온 반응이었다. 2024년 한국에 사는 아이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식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태어났다.
세계인과 ‘K팝’ ‘K드라마’를 함께 듣고 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모국어로 읽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아이가 그런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존엄을 지키며 산다는 건 뿌듯한 일이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아이와 나는 45년의 세월을 거슬러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 낡은 흑백 필름이 돌아갔지만 3일 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6시간은 ‘서울의 봄’을 다시 보는 듯했다.
‘서울의 봄’에 빗대 ‘서울의 밤’이라 불리는 이날, 총을 든 군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서울의 봄’과 ‘서울의 밤’은 분명히 달랐다. 역사적 퇴행의 순간이라는 건 같지만,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는 달랐다. 이날 밤 11시 48분 국회 경내에는 헬기를 타고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됐다.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창문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으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해태(懈怠) 아니고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들은 흥분한 시민을 달래기도 했고, 다칠까 조심하며 움직였다. 길을 터준 시민들에겐 경례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퇴각했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증거”라는 어이없는 변명이 흘러나온다.
실패를 상정하고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냈을 리 없다. 적이 아닌 국민과 싸우라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든지, 명분 없는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가 두려웠든지 간에 민주적 사고가 훈련된 청년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흠뻑 젖어 자란 세대다. 대학가에서는 비상계엄의 초법적, 위헌적 행위를 지적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는 4일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 했고 고려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서울대는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비상계엄을 두고 이들은 교과서대로 저항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신한 건 윤 대통령 우리 역사에서 ‘서울의 봄’과 ‘서울의 밤’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낙관하는 건 “돌아가라”며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과 즉각 본회의를 소집한 국회가 보여준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다. 한편으론 비관한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정당성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어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오로지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폭주가 남긴 내상과 국격 훼손이 너무 크다. 하지만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고 자라 2016년 대통령 탄핵과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학습한 청년 세대는 비민주적인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은 결코 역사를 뒤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